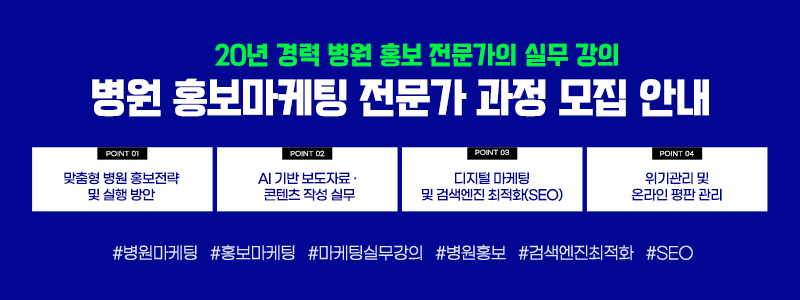단 음식, 고지방 음식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한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이를 일종의 보상으로 학습하게 되고, 결국 무의식적으로 같은 음식을 계속 찾게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 우울감,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음식은 일시적인 위로 수단이 되고, 중독은 더욱 강화된다.
서민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음식 중독은 술이나 담배 중독처럼 뇌의 보상 체계 이상과 관련된 문제”라며,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식 중독은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 반복적인 과식은 비만,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진다. 혈당과 인슐린 조절이 어려워지면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도 겪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크다.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 후 밀려오는 죄책감, 자존감 저하, 불안과 우울감이 반복되면서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에도 문제가 생긴다. 식사로 감정을 해결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더 고립시키고,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포만감을 느끼는데도 계속 먹는 행동, 과식을 줄이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패턴, 먹고 난 후의 죄책감, 음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음식 중독 여부는 자기 보고 설문이나 섭식 행동 검사,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식 중독은 단순한 식단 조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지행동치료, 영양 상담,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단정 짓지 않는 것이다.
서민석 교수는 “음식 중독 위험군의 공통점은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며, “식사일지를 기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과식하는지를 파악하면 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혼밥’이 일상이 되면서 무심코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혼밥할 땐 미리 정해둔 양만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남은 음식을 바로 치우는 습관이 필요하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도 섭취량을 늘리기 쉬운 환경이다.
서 교수는 “식사 환경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음식 중독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지만, 감정의 해소 수단이 되어버리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 음식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삶의 균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