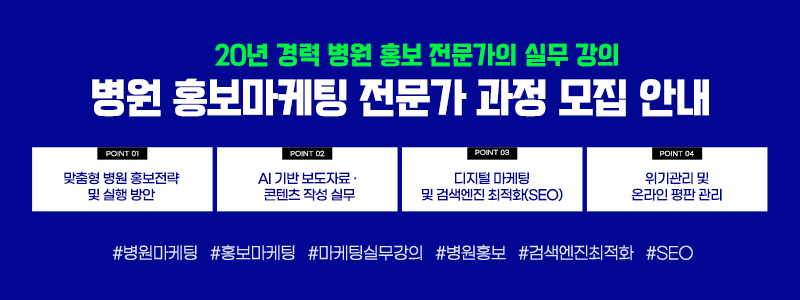신동욱·조인영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암 진단 전후로 건강검진을 받은 26만9000여 명을 2019년까지 추적 조사했다.
연구팀은 흡연 습관 변화에 따라 환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암 진단 전후에도 계속 흡연한 ‘지속 흡연군’, 암 진단을 계기로 금연한 ‘금연군’, 암 이후 흡연을 시작했거나 다시 피기 시작한 ‘재흡연/흡연 시작군’, 그리고 처음부터 비흡연자인 ‘지속 비흡연군’으로 분류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속 흡연군은 심근경색 위험이 비흡연군에 비해 64% 높았고, 허혈성 뇌졸중은 61%, 심부전은 55% 더 높았다. 흡연을 중단하지 않은 것이 심혈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재흡연 또는 암 진단 이후 흡연을 시작한 그룹도 심근경색 위험이 53%, 허혈성 뇌졸중 29%, 심부전 28%까지 증가했다. 반면 금연군은 세 질환 모두 위험이 일정 부분 남아 있었지만, 흡연을 지속한 그룹보다는 확실히 낮았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심방세동 위험이다. 금연군은 비흡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험이 낮아졌고, 재흡연군 역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흡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책임자인 신동욱 교수는 “흡연은 혈관 손상과 염증, 혈전 형성을 촉진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키운다”며 “항암치료로 심장에 부담이 가중된 암 환자에게는 이중의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혼자 금연하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