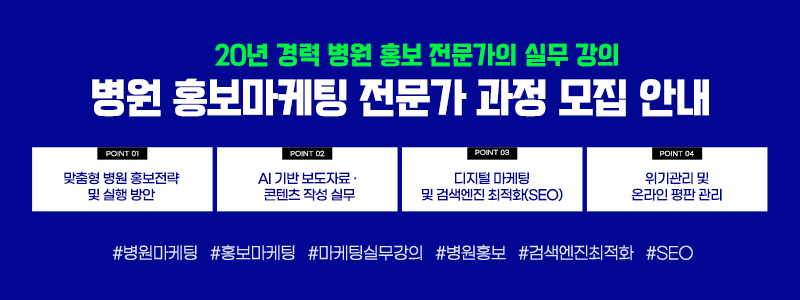최근에는 이경규, 김구라, 이병헌 등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고백한 연예인들도 있어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황장애는 별다른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갑작스럽게 공포감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된다. 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상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가슴 두근거림, 왼쪽 가슴의 찌릿한 통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공황 발작의 빈도는 늘지만 강도는 다소 줄어든다. 이때 환자들은 공황 증상이 나타난 장소를 피하려는 회피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계단을 고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장·식당·교회 등 사람 많은 밀폐 공간을 기피하게 되고, 나아가 혼자 외출조차 어려워지는 광장공포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면, 자가 진단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증상은 자율신경실조증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자율신경실조증과 공황장애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율신경계 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1년 약 1만 2천 명에서 2021년 약 2만 7천 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교감신경은 긴장 상황에서 신체가 빠르게 반응하도록 돕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회복을 담당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다양한 불편이 나타난다.
자율신경실조증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감염, 자가면역질환, 당뇨, 약물,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임상에서는 예민하고 긴장도가 높은 환자, 과도한 업무나 육아,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증상이 급격히 심화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된다.
자율신경실조증 치료의 핵심은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경안정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자가 조절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안정시키는 방식의 접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편, 자율신경실조증은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다른 질환으로 번질 수 있어, 단순 스트레스나 피로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사상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는, 조기에 대응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공황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불면, 불안 등 다양한 신경정신 질환이 동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 서현욱 해아림한의원 마포신촌점 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