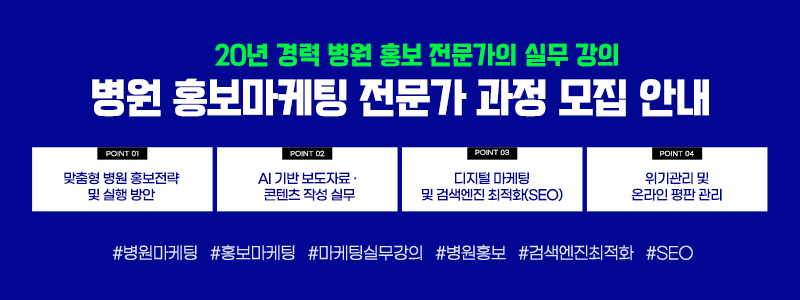다발성경화증, 착각한 면역이 신경을 공격할 때
다발성경화증은 면역체계가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수초)을 이물질로 오인해 공격하면서 발생한다. 그 결과 신경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기고, 온몸에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퍼진다.
주로 20~40대에서 시작되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유전적 소인, 비타민D 부족, 흡연, 과음, 청소년기 비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유병률이 높다는 점은 햇볕과의 연관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발성경화증은 하나의 얼굴을 갖지 않는다. 하루는 시야가 흐리고, 다음 날은 손에 감각이 없다. 어떤 날은 다리가 무겁고, 어떤 날은 두 개로 보이는 세상과 마주한다.
시신경, 척수, 대뇌 등 공격받는 부위에 따라 증상도 달라진다. 시력 저하, 복시, 안면 마비, 실어증, 걸음걸이 이상, 극심한 피로, 인지 저하, 우울감까지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어려워진다.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증상이 다양하다는 것은 곧 ‘진단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완치보다 ‘조기 진단’이 먼저다
다발성경화증은 치료보다 진단이 더 까다롭다. 유사한 증상을 가진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은 기본, 여기에 뇌 MRI, 뇌척수액 검사, 유발전위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통해 감별해야 한다.
진단이 내려졌다면 치료는 두 갈래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급성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억제한다. 반응이 없으면 혈장교환술이 고려된다. 이후엔 질병조절치료로 넘어간다. 재발을 줄이고 장애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로, 최근엔 주사제뿐 아니라 경구제 등 다양한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백 교수는 “비슷한 증상에 속지 말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