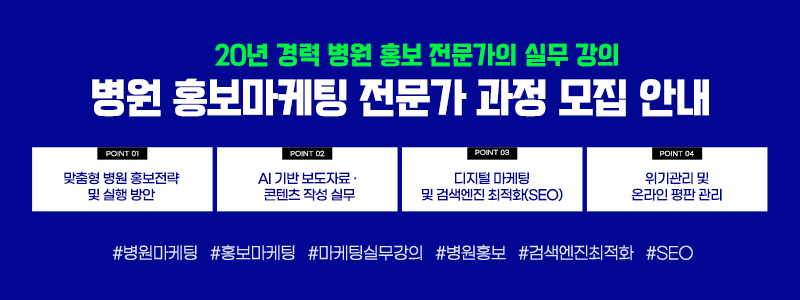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 김정한 이대목동병원 교수, 심진아 한림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2~2021년 진행암 환자 51만 5천여 명의 임종 전 6개월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환자 절반 이상(55.9%)이 임종 전 6개월 동안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했으며, 특히 ‘임종 전 1~3개월’ 구간에서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사용량은 ‘임종 전 2주~1개월’에 집중됐다.
광범위항생제는 여러 세균에 효과가 있지만, 정상 세균까지 공격할 수 있어 부작용과 내성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감염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열이나 염증 수치만으로 항생제가 과다 처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암 종류별로는 혈액암 환자(비호지킨 림프종·백혈병·다발성 골수종)이 고형암 환자(폐암·간암·위암 등)보다 사용률과 사용량이 모두 높았다. 특히 백혈병 환자는 폐암 환자보다 임종 직전 사용률이 1.5배, 사용량이 1.21배 많았다.
연구팀은 “환자의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임종 3개월 전부터 입원과 항생제 치료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시기에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완화의료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말기 환자라도 치료 이익이 명확하다면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투여는 부작용과 내성 위험을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Network Open』(IF 13.8)에 게재됐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